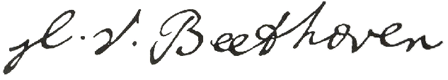
Ludwig van Beethoven
String Quartet No. 14, in C-sharp minor, Op. 131
제 3악장
제 4악장
제 3악장.
어떤 실제적인 중단도 없이, 두개의 강력한 화음이 나단조로 두들겨진다(주화음과 7화음). 세번째 부분인 Allegro moderato - Adagio는 비록 악상기호는 F#단조로 표기되어 있지만 나단조의 조성이며, 보통 빠르기로서,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길고 느린 악장의 도입부를 형성한다. 이 도입부는 11마디의 길이며, Adagio의 악구는 7번째 마디에서 시작하는데, 나단조에서 올림 바단조를 거쳐 마장조로 이행하는 약음의 음형으로부터 나타나는 레시타티브이며, 제 1 바이올린에서 piu vivace로 연주되는 잔물결 치는 16분음표의 악구가 헨델풍의 섬세한 장식적 음형으로 끝을 맺는다.
제 4악장.
그리고는 네번째 악장인 가장조, 2/4박자의 Andante, ma non troppo e molto cantabile가 시작된다. Wagner는 이 시적인 악장을 베토벤이 그 자신의 끝없는 기쁨을 위하여 사랑스러운 환영에 마술을 거는 마법의 작품이며, 완벽한 순수의 체현으로서, 이 이상적인 모습은 예술가의 천재성이 흩뿌린 광휘 속에서 수없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변형된다고 이야기했다.
'대변주곡(grand variation)'의 극점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이 시점까지 베토벤이 이 형식을 확대해서 사용한 곳은 현악사중주 올림 마 장조, 12번, Op. 127의 Adagio 악장에서 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술적 기교를 사용한 이 두 악장 사이에는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유사성의 저변에 근본적인 상이점이 나타난다. Op. 127의 Adagio에서는 변주가 주로, 성격상 순수하게 명상적인 이 주제에 대해, 상상력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각도에서 주제의 표현적 소재들을 발전시키고 이 주제를 제시하는데 사용되었다.
반면에 Op. 131의 Andante에서의 변주들은 단일한 심상이 보다 완벽한 표현을 찾아가는 매개체로서보다 훨씬 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변주는 이 예술가의 변화하는 판타지를 따르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서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충만함과 풍요로움에 가득 찬 그의 내부의 생기의 영향으로 새로이 조형되면서, 이 심상의 지속적인 변모를 드러낸다. 상상에 잠긴 심상의 이러한 지속적 변모에 음악적 상념이 연결되어,
단순히 같은 상념의 기술적 변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상념들이 채워진다 .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상념들은 다시 그들의 의미의 가장 미묘한 음영을 표현하는 유연한 주제적 결합들을 낳는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의미의 음영들에게서 그들을 낳게 한 애초의 상상의 상념을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솟아 나왔고, 그 가장 작은 발아들조차도 그들을 품은 거대한 가지들의 성장을 축소하여 드러낸다. 넓은 시야로 볼 때, 이 작품에는 기적이라 불러서 전혀 손색이 없는 형식적이고 심리적인 통일성이 존재한다.
주제는 32마디에 이르는데, 두개의 내재된 여덟 마디의 악구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악보 232와 233)
ex 233
분위기는 빛나는 투명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바그너의 표현대로 '순수의 체현'이다. 베이스에서의 리듬감 있는 피치카토의 8분음표 위로 두 바이올린들이 서로 교차하는 멜로디 안에서 주제의 요소들을 상성부와 저성부로 차례로 나누어서는, 각 여덟 마디의 악구들을 이중으로, 그리고 매우 변형된 모습으로, 재 제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연주한다. 두번째 악구는 깊고 친밀한 느낌의 종지로 끝난다.
첫번째 변주는 반음계적인 16분음표의 음형이 교차하는 변형된 액센트와 리듬으로 주제를 보여준다.
보기의 마지막 마디에 바로 이어 내성부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폴리포니가 두터워진다. 길게 이어지는 crescendi는 고요한 정적의 악구들과 교차해서 나타난다. 특히 변주의 마지막 마디들에서 눈에 띄는 주제의 음가의 변화는 그 전개에 솟아오르는 생명의 질감을 더한다.
두번째 변주(piu mosso, 4/4박자)는 전원적인 신선한 분위기로 시작하며(악보 236),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규칙적인 8분음표로 표기된 지속적 북연타 음형과, 이음줄로 연결된 8분음표들로 구성된 모티브(악보 236의 두번째와 네번째 마디)의 확대에 의해 곧 힘찬 성격을 띄게된다. 그 모티브는 마침내 내성부에서의 변조된 모방 음형들과 함께
그 다음의 변주는 Andante moderato e lusinghiero라는 악상기호가 붙어있다. Lusinghiero, 즉 달콤하게(어떤 피아노 악보는 이 중요한 악상기호를 빼먹었다). 이전 변주에서 보여지는 열정의 무아경과, 처음에는 베이스들에서, 그 다음에는 바이올린들로 캐논풍으로 모방해가며 펼치는 이 윤택한 대화의 단순성에서 나타나는 무아경의 사이에는 일종의 충격적인 대비감이 존재한다:
보기의 마지막 마디의 트릴 음형은 이 제시를 뒤따르는 전개의 소재로 쓰이는데, 이 캐논풍의 전개는 마지막 두 마디에서 유별난 방식으로 확대되어 네번째 변주를 도입한다.
이 변주(Adagio, 6/8 박자)는 모든 성부가 고음에서 시작한다(악보 239); 제 1 바이올린이 완만하고 둥근 멜로디의 밑그림을 펼치면 마치 팀파니의 울림과 같은 강렬한 피치카토로서 제 2 바이올린과 첼로가 sforzato로 중단시킨다.
악보 239의 세번째 마디에서 제 1 바이올린의 처음 네개의 음표는 뒤따르는 전개(보기 240)의 기초로 쓰인다.
이것은 순전히 '사중주적 형식'이다. 그러나 그 명백한 편안함과 우아함이 밑그림을 확대하도록 길을 열어서는, 마지막 마디들에서 성부와 모티브가 뒤섞여서 빛나는 극적 효과를 가져오는 번뜩이는 음향의 직물을 잦아낸다. 이 모든 것들이 베토벤 시대의 음악세계를 매료시킨 상상력과 매력을 드러내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경이 또한 그에 못미치지 않는다. 몰아적 내적 생명감의 이러한 표현에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작곡가의 친구들이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베토벤은 오늘 다시 환희에 빠졌다(The Master has a raptus again to-day)!"
Allegretto, 4/2 박자의 다섯번째 변주에서는, 마치 풍경의 전면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보인다. 뒤틀린 주제는 겨우 그 흔적만을 남긴 채, 생경한 화음을 통하여 긴 오르간음이 떠받치는 코랄의 의상을 덧입는다:
두번째 부분이 시작될 때, Op.101 소나타의 모티브 하나를 연상시키는 멜로디의 단편이 도망치듯 하는 모습으로 한 번 나타났다가는 다시 곧바로 지속 화음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진다(보기 242).
변주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은 다시 스러져서는, 첼로의 매우 높은 음역에서 주제의 두번째 악절의 음형을 거의 그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연주하게 된다.
이 변주의 명상적인 성격은 여섯번째 변주와 마지막 변주를 가득 채우는 진지한 기원의 분위기를 예감하게 한다. 매우 발전된 Adagio, ma non troppo e semplice, 9/4의 이 변주는 아마도 이 사중주 전체의 클라이맥스일 것이다. 여기에서 구현된 것과 같은 사무치는 내적 성찰의 깊이에 도달한 악곡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빛나는 악절에 관하여 베토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괴테의 말을 인용했을 것이다: Ich habe da viel hinein geheimniss(나는 여기에 많은 비밀스런 생각들을 숨겨 놓았다)....... 이 멜로디의 기원을 악보 232[변주의 원래 주제]의 부드럽고 전원적인 모티브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처음 연주된 다음에 색다른 첼로의 음형 위에서 한 옥타브 높여서 다시 연주된다.
여기서 모든 것은 광휘와 빛이다. 그러나, 17번째 마디 이후부터는 악장의 느낌에 불안이 깃든다. [위에서 말한] 첼로의 음형이 포르테로 연주되며, 다른 성부들은 그 동안 불안하고 두렵게 원래의 주제를 연주한다. 이어지는 전개에서 같은 음형이 포르테와 피아노로 교차하여 나타나서는 경과적 연결악구로서 제 1 바이올린으로 이어진 다음 첼로에서의 ground bass로서 끝난다. 나단조와 내림 나장조를 구축하려고 애쓰면서 전조하는 가운데에도 기본적인 조성은 유지된다. 이 경과구를 들으면 슈만의 피아노 작품 '겁주기[어린이 정경]'가 떠오른다. 그 작품 역시 끊임없는 두려움의 인상을 빚어내고는 있으나, 베토벤의 정서는 심오하게 느껴지는데 반해, 슈만의 기분은 변덕스럽고, 단지 일종의 유치한 으름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고뇌에 찬 애원의 색조를 띠고서, 이 심금을 울리는 기도는 마침내 그에 걸맞는 종지로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시점부터 변주는 일종의 코다에 의해서 연장된다. 그것은 레시타티브풍의 로맨틱한 대화의 형태를 띄고서, 저성부들이 분산화음으로 스러지는 트릴로서 끝난다(보기 245는 제 1 바이올린에서의 마지막 악구와 트릴이 나오는 첫번째 마디를 보여준다).
그 트릴(B, C#, C)은 가 단조와 바 장조(다장조의 버금딸림조)로 전조된다. 그리고 예고 없이 원래의 주제가 다장조로 다시 나타나는데(Allegretto, 2/4 박자), 그 성격은 처음과는 많이 변화하여 부드럽고 감성적인 면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대신 시골 무도곡 풍으로 생기에 차있다. 이런 인상은 제 1 바이올린이 선율적 음형을 반복(sempre piu allegro, crescendo)하면서 사라지는데, 그 선율은 처음에는 종지 화음들 위에서 연주되고, 다음에는 홀로 연주되어서는, 이전에 스며들었던 모든 혼란된 회상들을 쫓아버리기나 하려는 듯이 트릴 악구로 끝난다. 마지막 속박의 흔적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아래로는 첼로가 하프같은 음형을 연주하고 위로는 제 1 바이올린이 트릴의 화환을 수놓는 엄숙하고 장려한 악절에서, 원래의 주제가 제 2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통해 가장조로 다시 나타난다. 이 경과구는 단지 일곱 마디 동안만 지속된다(악보 246).
저성부들이 이번에는 사분음표가 아니라 8분음표의 3연음으로 구성된 분산화음적인 음형들을 크레센도로 연주하는 위에서 트릴로 연주되는 음형이 제 1 바이올린에서 다시 들린다. 하나의 새로운 경과구가 바장조의 알레그레토로 뒤따른다. 이번에는 주 조성의 복귀는 또한 악장의 종결을 나타낸다. 제 1 바이올린이 레시타티브풍의 악절을 펼치면 아래의 성부들은 각진 짧은 화음들로 점점이 장식한다. [처음의 출현보다] 한 옥타브 높게 종지음형(악보 233의 마지막 마디)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일련의 작별의 모티브들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이며, 이 모티브들은 우아한 선율적 구도 속에서 합쳐진다. 주제의 요소들은 쪼개지고 흩어져서 7화음 위에서 멈추었다가는 주화음으로 연주되는 두개의 부드러운 피치카토로서 마침내 사라진다. 여기에 나타나는 개개의 음표들은 독특한 중요성을 띄는데, 오직 베토벤의 말기 양식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각자의 극단적인 상상력으로 두드러진다. 만일 방금 지나온 음악적 행로를 되짚어 본다면, 처음에 원래의 주제를 제시할 때부터 이들 마지막 화음들에 이르기까지, 마치 작곡가가 자신의 길을 가며 정신적 경험의 헤아릴 수 없이 변화하는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그의 상상력의 보고가 낳은 보화들을 널리 흩뿌리는 듯이 보인다.
'Beethove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에토벤 현악 사중주 14번 - 1악장 (0) | 2008.10.22 |
|---|---|
| 베에토벤 현악 사중주 14번 - 2악장 (0) | 2008.10.22 |
| 베에토벤 현악 사중주 14번 - 5악장 (0) | 2008.10.22 |
| 베에토벤 현악 사중주 14번, 6, 7악장 (0) | 2008.10.22 |
| 베토벤의 초상화 (0) | 2008.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