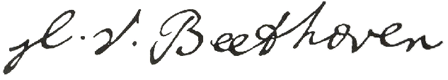
Ludwig van Beethoven
*태림 출판사 스코어 해설
String Quartet No. 15, in A minor, Op. 132
베토벤의 후기 작품이라고 보통 불리우고 있는 여러 작품은 그가 56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 10 몇년간의 소산이다.
그 연대 중에서도 이 곡과 같은 작풍이 비롯되는 50세 앞 뒤의 무렵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육체적인 고난(더욱 그것은 곧 정신적 고통으로 전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종류의)과 영혼의 고독과의 긴 투쟁을 거쳐서 인간 베토벤의 정신 생활이 점차로 순수화되면서 그 그늘에는 두드러진 깊이를 더하고 예술가로서의 내용의, 새로운 질적 형성이 나아가고 있던 시기에 해당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질은 당연히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기술적으로는 폴리포닉한 수법의 적극화와, 고귀하고 그 위에 현실적 박력이 있는 표현이 이 시기의 작품을 특징짓기에 이르는데 그것들은 끊어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폴리포닉한 기법, 그것은 대위법적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 같은 것의 좀 불충분한 인상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하 부자의 세대의 것과 같은 18세기풍의, 기악적 폴리포니의 대위법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18세기풍의 대위법은(보다 정확하게는 베토벤의 이 갈래의 폴리포니의 양식은) 베토벤의 작풍과 두드러지게 질적인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문기술적으로 보아서 동질의 바탕위에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혹은 그 때문에 베토벤이 새로운 표현의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구하여 배운 것은 16 - 17세기의 성악적 폴리포니 특유의 기법인 듯하다. 그 성행기인 16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에는 팔레스트리나나 오를란도 랏소(Orlando di Lasso) 등이 있는 바로 저 양식이다. 15 - 16세기의 그와 같은 무반주 합창곡의 뒤를 받아서 17세기는 과도적 양식이라고는 하면서도 앞 시대의 정신과 수법이 기악이라는 신흥의 장르 속에 제법 살아 남았던 시대이다.
그것들은 앞서 기술한 18세기 및 19세기풍의 양식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었다. 바그너, 드뷔시 이래 표면적으로는 몇 번 변전하면서 지금도 융성하게 이어지고 있는 18 - 19세기에의 반동적 경향의 근거의 하나는, 그와 같은 고악의 이질성에 있는데 베토벤 또한 그것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의 후기 작품, 특히 현악 사중주곡과 피아노 소나타 일군이 포함하는 근대성의 근거는 주로 그것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와 같은 이질성에의 관심을 자극한 것은 그의 창작 논리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질적 변화에 다름 아니었다.
그는 그것들로부터 배운 것에 기존의 기술과 창의를 더하는 것에 의하여 만년의 마음의 자세를 후기 여러 작품의 시적인 아름다움 속에 투입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현악사중주곡에서는 리듬감과 화성감과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유연성(다시 말하면 미끈하게 흘러가서 그치지 않는 유연한 화음의 운용)은 참으로 고악의 정신에 옮겨 탄 것이다.
그 밖의 특징, 이를테면 성부의 선율선들을 서로 입체적으로 관련시키는 방법은 17 - 18세기를 통한 기악적 유산의 계승인 것이며, 악곡 형식의 자연스러우며 완전 무결한 탄력성은 그의 독특한 수련과 구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곡만 하여도 적어도 제 3악장 등은 참으로 그 자신의 시대를 훨씬(반세기 이상이나)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후기의 현악 사중주곡, 작품 127, 130, 131, 132, 135는 죽음 직전의 수년간에 거의 서로 전후하여 만들어지고, 9번 교향곡, 장엄 미사, 몇 곡의 피아노 소나타 등의 완성 후이니까 대작의 절필을 이룬다.
이상 중 작품번호의 순서는 일부 뒤바뀌어, 작품 127(1824) 다음에 이 작품(작품 132)이 만들어졌다.
1825년 4월 중순에 이 곡의 완성을 앞두고 상당히 무거운 병상에 누워서 몇 주간 중단되고, 8월에 일부의 계획을 변경하여 완성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변경된 것은 제 3악장이 병중, 병후의 체험을 반영하여 전혀 다른 주제로 작곡된 것이라고 한다.
초연은 비인에서 동년 4월 9일(비공개), 11월 6일(공개) 이루어졌다.
피날레의 주제는 노테뵘에 의하면 합창 교향곡의 기악적 피날레(합창 교향곡을 성악이 포함되지 않은 순 기악곡으로 작곡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전해진다)에 쓸 예정이었으므로, 스케치북에는 라 단조로 되어 있다.
베토벤은 만년에 피아노 소나타에 두악장만 가진 것을, 현악 사중주에는 4악장에서 7악장까지 가진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이 가단조 사중주는 모두 5악장으로 되어 있다.
악곡 형식의 분석
(아라비아 숫자 : 마디 번호)
- 제시부 : 1 - 74
- 1 - 39 : 제 1 주제-a, 제 1 주제-b의 제시와 확보
- 서주의 첼로 1 - 2 : 제 1 주제-a
- 9 - 10 : 에피소드
- 11 - 18 : 제 1 주제-b
- 40 - 47 : 경과적 악구를 포함한 다리
- 48 - 56 : 제 2 주제와 확보
- 57 - 74 : 종결 부분(제 1 주제에 바탕을 둠)
- 1 - 39 : 제 1 주제-a, 제 1 주제-b의 제시와 확보
- 전개부 : 75 - 118
- 제 1 주제 a와 b의 동기 조작
- 제 1 재현부 : 119 - 192
- 조바꿈
- 주요 주제의 변주와 동기 조작
- 제 2 재현부 : 193 - 231
- 으뜸조
- 주부 주제의 악구와 동기 조작
- 코다 : 232 - 264
- 주요 주제의 변주와 악구
- 부주제의 동기
제 2악장 : 겹세도막 형식, 내성적인 스케르쪼의 선구
- 주부 : 1 - 119
- 1 - 22 : A
- 주제부
- 주요 동기는 제 1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1 - 2 마디 및 5 - 6 마디
- 23 - 70 : B
- 주제의 악상 조작
- 조바꿈은 적고 으뜸음 중심
- 71 - 99 : A'(주제부를 변형하여 재현)
- 100 - 103 : 주제의 동기를 사용한 경과구
- 104 - 119 : 주제의 동기에 의한 코다
- 1 - 22 : A
- 중간부 : 120 - 238
- 현악 사중주곡으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창의가 풍부한 새로운 음색의 효과가 노려지고 있다. 특히 120 - 140, 222 - 238 마디들에서 보이는 오르간풍의 효과는 이색적이다.
- 구성은 a(120 - 130마디에서의 제 1 바이올린), b(121 - 122 마디에서 제 2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동기), c(141 - 143마디에서 비올라와 바이올린이 응답하는 부분)를 주요 악상으로 하여 적당히 짝짓고 있다.
- 주부 반복(다카포)
제 3 악장
3악장의 세번째 아다지오 부분(아래 설명의 다섯번째 부분); "가장 깊은 감동을 가지고(Mit innigster Empfindung)"라고 지정되어 있으며, 함께 있는 이태리어(Con intissimo sentimento)는 베에토벤 자신이 쓴 것은 아니라고 감정되고 있다. 제 2 바이올린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성부가 받아서 차례로 코랄 주제를 연주하며 한없이 높은 곳으로 이끌어간다.(지킴이 주)
간주 내지는 제 2 주제를 가진 변주곡. '병상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리디아조의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다. 원 악보의 독일어는 작곡자 자신의 자필이며, 이탈리아어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감정된다. 이 악장은 베토벤의 전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것의 하나일 것이다. 기법적으로는 16세기 이래의 유산의 전용이나 영향과 병행하여 후세의 수법의 어느 것마저 예감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구사가 남김없이 내용상의 요구와 합치하고 있어서, 사소한 공전도 찾을 수 없다. 스케치가 보이지 않으므로 병상의 실감을 담아 단숨에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구성은 5부분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지만 각 부분 사이의 연결은 지극히 매끄럽게 이어진다. 처음 나오는 몰토 아다지오가 코랄의 주제 부분이다. 보다 진정한 코랄풍의 주제는 2분음표부분의 제 1 바이올린의 소리를 이어가면 분명해진다. 곡의 처음과 중간에 4분음표의 조용한 동기가 더하여져서 그것을 꾸미고, 동시에 그것이 뒤의 변주를 위한 중요한 기초 악상을 이루고 있다. 리디아 선법은 중세의 교회 선법 가운데서도 낡은 것의 하나이며, 후대에는 임시표에 의한 내림마음이 많아져서 바 장조의 제 4도가 항상 반음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베토벤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팔레스트리나 이전의 참된 원형에 따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17세기풍의 절충적인 수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각 부분의 기악적인 양식과도, 또한 당시의 음악적 조류의 기조와도 관련되어 부득이한 한계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주제의 변주를 이루는 것이 제 3, 제 5부분(모두 몰토 아다지오)에서 그것들의 중간에 삽입되는 제 2, 제 4부분(둘 다 안단테)이 간주 또는 부차적 주제와 그 변주이다. 제 2 부분의 안단테는 작곡자 자신의 수기로 "새로운 힘을 느끼면서"라고 적혀 있는데, 제 1 부분의 성악적 스타일과 대조적인 기악적 수법의 채용에 의해 그 문구는 정당화된다. 그러나 화성과 리듬은 여기에서도 17세기를 상기시키는 듯한 태도를 잘 보전하고 있다.
제 3 부분은 몰토 아다지오의 제 1 변주이다. 역시 17세기풍의 코랄 변주곡 양식이다. 즉, 제 1 바이올린에 코랄이 2분음표로 배치되고, 제 1 부분의 8분음표의 동기의 변주가 그것에 동반한다. 제 4 부분은 안단테의 변주에 의한 간주이다. 이와 같은 주된 변주의 간주에 다른 변주를 쓴다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몇 번인가 사용한 적이 있던 수법이다. 곡상의 대조는 날카로우면서도 훌륭히 통일되어 있다.
제 5 부분은 몰토 아다지오의 제 2 변주로, "가장 내면적인 감동을 가지고서"라고 지정된, 상당히 정성어린 코랄 변주곡이며, 조용하고 감동적인 코다가 리디아 선법으로 끝난다.
제 4 악장 : 두도막 형식의 알라 마르치아(Alla marcia - 행진곡 풍으로)
앞 악장의 안단테와 내용적, 조성적으로 친근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언뜻 그것의, 말하자면 성격적인 제 2 변주라고 생각하는데, 악상 형식의 곤련은 전혀 없다. 각각 8마디와 16마디의 짤ㅁ은 주부에 약 20마디의 덧붙인 부분이 이어진다. 첫번째의 1 - 8마디까지는 주제이며, 리듬에 폴리포닉한 혼란이 있고, 1 - 2마디의 소재를 기초 악상으로 하여 구성된다. 두번째의 9 - 24마디는 주제의 악상 조작의 결실이다. 그 뒤에 제 9 교향곡의 일부를 상기시키는 피날레에의 경과적인 다리(25 - 46 마디)가 붙는다. 제 1 바이올린의 레시타티보가 중심을 이룬다.
끝악장 : 론도 형식에 의한 정열적인 악장
전체 구성 : [A1] - [B1] - [A2 - C - A3] - B2 - A4 - CODA
- 1 - 50 : A1(주요 주제의 제시와 확보, 가 단조)
- 제 1 주제 : 3 - 10 마디 + 19 - 26 마디
- 주요 동기 : 제 1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3 - 4 마디, 19 - 20 마디
- 51 - 82 : B1(주요 주제로부터 파생한 부 주제 있음)
- 83 - 89 : 경과구
- 보조 음형 : 83 - 84
- 90 - 123 : A2(주요 주제)
- 123 - 175 : C(전개부)
- 주요 주제의 동기 조작
- 176 - 207 : A3(주요 주제)
- 208 - 241 : B2(부 주제 등)
- 241 - 273 : 보조 음형의 작은 전개
- 주 주제의 동기가 더하여진다.
- 274 - 297 : A4(주요 주제)
- 298 - 404 : Coda(제 2 전개부에 가깝다)
- 주요 주제의 동기
- 가 장조로 마친다
자료의 전재를 허락해 주신 (주)태림 출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eethove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에토벤 현악 사중주 14번, 6, 7악장 (0) | 2008.10.22 |
|---|---|
| 베토벤의 초상화 (0) | 2008.10.21 |
|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개관 (0) | 2008.10.15 |
| 베에토벤 장엄미사, Missa Solemnis Op. 123 in D-major (0) | 2008.10.15 |
| 베에토벤 교향곡 제 9번 라 단조, Op. 125 합창, 태림 출판사 스코어 해설 (0) | 2008.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