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람스와 우리 시대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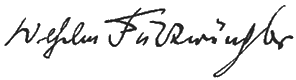 |
||
| ||
|
브람스와 우리 시대의 위기
시대와 대립된 원숙기의 예술
그것은 위대한 예술가들에게서 자주 보는 일이다. 마침 그들의 생애 한 가운데에서 주위의 세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또 자신의 예술에 대한 입장이 차차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일이다. 청춘시절에는 주위 세계의 요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요망이 딱 들어맞고 완전한 일치를 본다. 젊은 시절에는 그들의 예술도 "계절적"이고 인격의 표현도 철에 맞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만년이 되면서부터 자꾸 어긋나게 되고 뒤틀리게 된다. 그들은 자기 특유의 성격에서 나오는 가장 진지하고 가장 깊은 요구를 채워야 하겠다는 자각이 눈뜨기 시작한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관철하는 수도 있고 세계를 덮어 누르는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심으로 세계로부터의 분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진보적은 아니었던 만년
브람스는 때때로 이렇게 말했다. "음악사는 나에게 케루비니(Cherubini)와 같은 지위를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많은 브람스의 말이 그렇지만 회의적이고 애매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연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 브람스는 그 말로 자신을 비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에 의해서 이른바 "음악사"라는 것의 성격을 뚜렷이 하려고 하였다. 그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내용이라면 음악적 질량의 발전 그것으로 생각해왔다. 그것은 가령 악절법, 화성법,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음악적 경향, 유행, 영향만을 음악적 내용으로 생각해왔다. 작곡가도 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생각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경향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특성을 평가하려고 논쟁을 벌여온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지킨 최초의 사람
브람스는 음악사적인 의미와 예술적인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엇갈린 최초의 위대한 음악가였다. 브람스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시대의 죄였다. 베에토벤 조차도 시대에서 가장 떨어진 작곡양식으로 작곡했지만 자기 시대의 말로 작곡을 하고 표현의 가능성을 채우고 있었던 점에서는 역시 자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겠다. 그 의욕이 아무리 초시대적이고 미래에 이어진 것이라고 하나 시대의 의욕에 맞지 않은 점은 없었다. 바그너의 가장 대담하고 결정적인 작품도 그 작곡가의 거대한 인간정신을 표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시대의 의욕과 가능성을 채워주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시대에 대립하는 자기를 느끼고 있었어도 역시 시대의 표현이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베에토벤이나 바그너뿐 아니라, 더 근대의, 가령 슈트라우스나 레거나 드뷔시나 스트라빈스키 등도 역시 개인적인 의욕과 시대적인 의욕이 일치하고 있었다. 브람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두 의욕은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곡가
이런 까닭으로 브람스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깊은 내심에서 자기가 산 시대와 대결해야 했던 최초의 사람이다. 그것도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해야 했었다. 즉, 그것은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바뀌지 않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역사의 뜻은 음악적 진로 - 화성법이나 악절법 등의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진로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작곡가의 표현하는 의지에 위대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은 역사 발전의 뜻으로 본 표현의 "대담성"이나 "신선함"의 정도에 있지 않고 내면의 필연성, 인간성의 강도와 표현력의 거대함에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의 예술은 순수소박하고 언제나 인간적인 것이었다. (1934)
|

